조기섭 작품론
빛의 잔상을 그린다. 그 잔상은 자연을 보고 해석한 심경의 풍경이다. 그 빛이 형에 깃들면 상으로 보인다. 나는 그 순간이 평면에 발현되어 머금기 위한 작업 방식을 찾았다. 무한의 공간이 주는 서사에 주목해 작업을 하고 있다. 자연물과 대상에 내포된 무형의 공간을 화면에 표현하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심리와 사유의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독특한 감각의 지점을 드러내는 풍경을 그린다. 그것은 정신적인 영역에 맞닿아 있다. 작품 속 대상이 사각 화면에 갇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걸린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을 고민해왔다. 이를 통해 선택한 호분(흰색)과 은분만으로 표현한 그림은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스스로 살아 있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보는 위치에 따라 빛에 난반사되어 사라지고 주변의 색을 함축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 빛이 반사하기 좋은 은분을 쌓아 올리고 깎고 다듬어 작업한다.
붓질이 표면 위에서 흐놀 듯이 유영하며, 형상은 돌출과 퇴보를 반복한다. 평면에 깊이를 만들기 위해 그림의 표면을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우는 작업 과정은 모든 것을 ‘없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다섯 번의 지워냄은 수도의 자세로 허공에 그려내는 수행의 과정이다. 예민하게 갈아낸 흔적 아래로 이전에 그렸던 형상이 남아 있다.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발현되는 빛의 반사가 조도, 관객의 동선 등 그림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만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화면을 연출한다. 이때 빛의 반사로 인해 관객의 작은 움직임에도 미묘한 색채로 순간순간 변화하는 표면은 철저하게 시각의 영역에 기대어 있지만, 동시에 화면 위에 새겨진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빛을 통해 드러내면서 화면 전반에 촉각적인 감각을 함께 전달한다
❍ 본 것과 보이지 않은 것
무엇을 보았는가와 무엇을 그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記標와 記意,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그릴 때 사생의 자연이 아니라 마음에 각인된 기억을 소환해서 그린다. 자연이 마음에 들어오려면 한 현장을 시간과 계절, 날씨 등을 달리해서 다양하게 관찰하러 가야 한다. 걷고 멈추어 응시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감고 바라본다. 그렇게 관찰한 자연은 눈을 감아도 피부로 느껴지는 빛의 세기와 몸으로 흡수되는 공기의 질감과 함께 눈앞의 자연이 시공간으로 느껴져야 소환이 가능하다. 그것은 실경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공간 속 새로 그려진 이미지로 ‘심경’이다. 수행의 과정을 종이에 올린다. 본래의 하얀 바탕 위에 색이 올려지고 채워진다. 선이 가득 채워진 순간 공(空)으로 돌리기 위해 모든 걸 지워낸다.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수행의 시간(본질)은 화면에 남았다. 그림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 표면의 두께는 침식되었지만 그 흔적이 남는 것처럼 각자의 생(生)의 겹이 다시 해석되어 경(敬)의 지점(생각이나 헤아림을 중단한 상태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간직한다)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에 나의 작업이 있길 바란다.
❍ 작품 주제 - 백색도
백색도(Whiteness)는 물체 표면이 사람의 눈에 하얗게 느껴지는 정도, 즉 흰색을 특정 짓는 양을 말한다. 광원에 따라 표면의 명암에 따른 시감각을 다르게 표현하는 백색도는 층위를 가지는 은분 작업에서 형과 상의 돌출과 퇴보에 따라 반사율을 달리하며 독특한 환영(illusion)을 보여준다. 보이지 않은 것을 동양에서 상(象)이라고 하였으며 보이는 것을 형(形)이라고 한다. 보이지 않는 상을 가리켜 음(陰)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리켜 양(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상과 대조해서 말하면 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상은 보이게 하는 징조이고 형은 보이게 하는 것에 의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모든 것은 없음, 즉 무(無)라는 바탕 위에 존재한다. 관조의 결과 형에 상을 담는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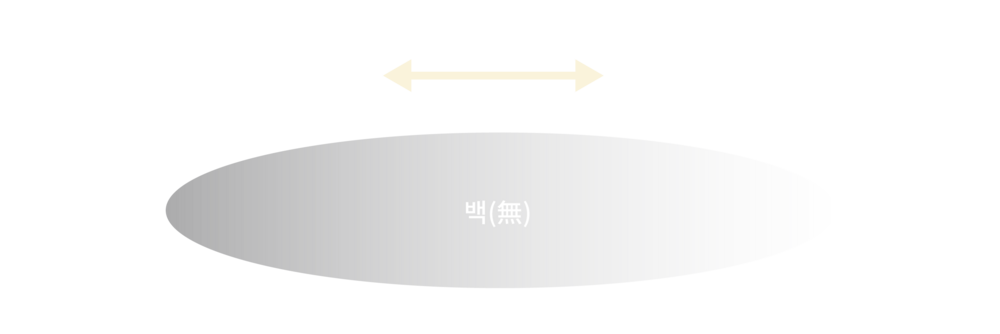
▸ 백(無)
많은 형상을 보고 그린 작가는 관조의 결과 형과 상이 사라지고 원래 종이에 남겨져 있던 행위와 흔적만이 남은 공(空)의 상태가 바탕이 된다.
▸ 색(形)
색을 함축하는 백색의 공간에 형상이 존재한다. 빛이 머물러 형(形)이 드러난다. 색이 없는 이 공간은 무한의 공간이다. 마음을 비운 관람자는 자연으로 걸어간다. 은분에 비춰 보이는 그림 속 관람자는 자연의 안과 밖에서 흐논다.
▸ 도(象)
시간적 공간이 찰나로 각인되는 자연에서 작가는 시각적 공간의 깊이를 화면에 담기 위하여 오브제로 조각상을 그렸다. 관람자를 위에서 내려 보았던 대상의 얼굴은 보는 이의 눈높이에 위치한다. 또렷한 형태의 오브제는 관람자의 걸음에 따라 독특한 환영(illusion)을 보여준다. 시선에서 사라지는 대상은 수평과 수직의 움직임에 따라 무한의 거리감으로 눈앞에 드러난다. 실재(實在)가 환영이 되고 환영이 실재가 되는 순간 대상과 나의 심리적 공간이 펼쳐진다.
❍ 빛을 보다
나는 눈 앞에 놓인 풍경을 바라보고 마음의 눈으로 해석한 심경을 그린다. 고요함 속에서 파동이 일어나는 오묘한 운치는 정(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動)적이며, 표면적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파동을 품고 있다. 색에 형상을 가두지 않고 은분(은색)과 호분(흰색)만을 사용함으로써 조도와 동선에 따라 다채로운 서사를 담아 독특한 환영을 보여준다. 모든 과정에는 쌓아 올리는 행위만이 아닌 화면에 올려진 형상을 다시 갈아내는 행위가 더해진다. 가느다란 붓이 유영하며 일구어낸 층위는 또다시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세밀한 샌딩(갈아내는) 작업으로 인해 형적을 남긴다. 수행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 작가가 수행의 과정을 종이에 올리고 또 갈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 단순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것을 공(空)으로 돌리고 남겨진 것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이다.
I paint afterimages of light. Such afterimages are landscapes of mental states that have been interpreted by watching nature. Once that light dwells in shape, it is seen as an image. I found a work method that enables such moments to emerge on flat surfaces and remain. My artworks focus on the narrative bestowed by the infinite space. I am working on paintings that express the intangible space contained in natural and other objects on the screen. I paint landscapes that reveal the psychology of objects and the ways of contemplation, and further, points of unique sensations regarding them. They intersect with the spiritual realm. I have been contemplating artworks that can create a space of life that endlessly changes by interacting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which the painting hangs, rather than ones in which objects are confined to a rectangular screen. Paintings selected by this process, expressed solely with clamshell powder (white) and silver powder, evoke even more mystic atmosphere and reveal their presence that are alive on their own. In order to create shapes that disappear with diffused reflections depending on viewing positions and compress the colors of surroundings, I pile, carve, and trim the silver powder that easily reflects light.
The brush strokes float around the surface as if to yearn, and the shape repeats protrusion and regression. I perform sanding work to grind the surface of paintings in order to create depth on the plane. Such process of erasing does not mean turning all into“nothingness.” Erasing five times is the process of self-cultivation to paint in the void in the attitude of ascetic practice. Under the sensitively grinded traces, the previously painted shapes remain. The reflection of light expressed through the characteristic of the materials meet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ainting such as the illuminance and audience’s movement, directing a screen that changes every moment. At such a moment, the surface, which changes from moment to moment into subtle colors even at the smallest movements of the audience due to the reflection of light, completely leans on the realm of vision. However, at the same time, it delievers a tectile sense to the entire screen by revealing the flow of time and space engraved on the screen through the light’s flow.
❍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I contemplate on what I saw and what I will paint. The signifiant (symbol) and signifie (meaning). I do not paint the shape. When I paint nature, I summon the memory imprinted in my heart rather than painting the wild. For nature to get into my heart, I have to go to the site at different times, seasons, and weather. I walk, stop, stare, lift my head to look at the sky, and gaze with my eyes closed. The nature observed this way can be summoned only when it is felt as time and space, along with the intensity of light felt through the skin and the texture of air absorbed by the body even with eyes closed. It is not a real scene, but an image of “mental state” newly drawn in the space created in my mind. I put on the paper the process of self-cultivation. Color is added and filled on the original white background. At the moment filled with lines, I erase everything to turn it into an empty space. Again, there is nothing, but the essential time of self-cultivation remains on the screen The painting is open to interpretation. I hope my artwork is at the starting point where the layers of each person’s life is reinterpreted and enters the point of Gyeong (the state where mind is kept silent as thinking or counting ceases), as if the thickness of the surface has been eroded but the traces remain.
❍ Artwork Theme - Whiteness
Whiteness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the surface of an object feels white, that is, the amount that specifies white. The whiteness, which expresses the visual sens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ight and shade of the surface depending on the light source, shows a unique illusion in layered silver powder works, by varying the reflectance according to the protrusion and regression of the shape and image. If the invisible is called image, the visible is called form in the East. If the invisible is referred to as yin, the invisible that is shown outward is referred to as yang. As opposed to image, this is called form. Thus, image is a sign that makes the visible, and form is revealed by that which makes it visible. Everything exists on the basis of nonexistence, the background that is nothingness. As a result of contemplation, I intend to show the process of putting the image in form in my ar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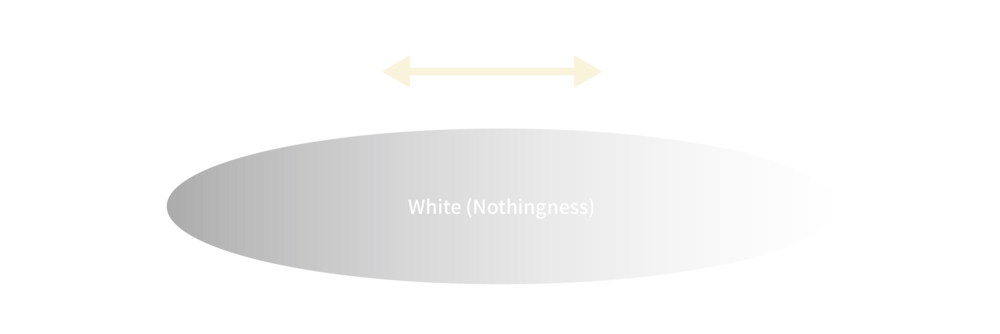
▸ White (Nothingness)
The artist has seen and painted various shapes. The texture, form, image of contemplation disappear; only the actions and traces that were originally on the paper are left behind forming the state of nothingness that becomes the basis.
▸ Color (Form)
Form exists in the white space that compresses the color. Light stays, revealing the form. This space that lacks color is a space without a limit. After emptying their minds, the audience walks into nature. The audience, seen in the painting reflected by the silver powder, yearns both in and out of nature.
▸ Painting (Image)
In nature where temporal space becomes imprinted as an instant, the artist painted a statue as an object in order to capture the depth of optical space on the screen. The object’s face that used to look down on the audience from above is placed at the viewer’s eye level. The distinctly shape
d object shows a unique illusion as the audience walk. The object that disappears from the gaze is then revealed in front of the eyes with a sense of infinite distance according to the horizontal movement. The moment reality turns into illusion and illusion into reality, the psychological space between the object and me unfolds.
❍ Seeing the Light
I look at the landscape before my eyes and paint the mental state that I interprete with the eyes of my mind. The mystic picturesqueness of the waves in stillness looks static but in fact is dynamic. By using only silver and white powder without confining the shape to colors, it shows a unique illusion with varied narratives according to the illuminance and paths of the movement. In all processes, not only the act of piling up but the act of grinding down what has been piled up on the screen is added. The layers created by slender brush floating around, once again leave traces as a result of the incalculable and detailed sanding work. One artwork is completed by repeating this process numerous times in a mindset of self-cultivator. When the artist performs the work of piling up on the paper, the process of self-cultivation, and then grinding it, it is not simply a return to the beginning, but is his determination to empty what is filled and turn that into nothingness, and to go one step forward via what is left behind.